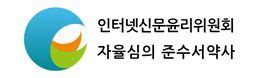31대 신문왕 9년 신라가 수도를 달구벌로 옮기려 했던 적이 있었다. 원래 수도를 옮기는 건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새로운 왕조가 생겼을 땐 전 왕조 귀족들의 정치기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다잡기 위해 수도를 새로 정하고는 했다. 마찬가지로 신라도 서기 668년 30대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을 이룩한 후, 새로운 통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라벌에서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고 시도한 것 같다.
31대 신문왕 9년 신라가 수도를 달구벌로 옮기려 했던 적이 있었다. 원래 수도를 옮기는 건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새로운 왕조가 생겼을 땐 전 왕조 귀족들의 정치기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다잡기 위해 수도를 새로 정하고는 했다. 마찬가지로 신라도 서기 668년 30대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을 이룩한 후, 새로운 통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라벌에서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고 시도한 것 같다.
학계에서는 신라왕실의 천도배경이 경주가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 전국을 통치하기 어렵다는 지리적 한계와 경주의 토착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도됐다고 보고 있다. 통일 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비대해진 서라벌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또 분지인 달구벌이 외침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군사적 요충지이어서 군사적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는 건국 이래 각 부족의 대표인 귀족들의 연맹체적 성격을 띤 귀족들의 발언권이 센 정치체제였다. 하지만 삼국통일 이후 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고 고구려, 백제 출신 백성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지방 세력으로 구성된 귀족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리더십이 필요했으므로 그 정책적 대안이 달구벌 천도이었을 것이다.
신문왕 9년 왕이 장산성(지금의 경산) 순행에 나섰다는 기록이 있다. 천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확인차 출장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서라벌 귀족인 기득권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그만큼 대구는 군사적 교통적 요지로서 신라시대 이래 중요한 도시였다.
물론 역사란 추측 불가 하겠지만, 당시 신라가 대구로 천도하고 지리적 여건을 잘 살려 국민통합을 했더라면 영토 확장과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 및 후삼국시대의 전개는 없었을지도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서라벌 중심의 폐쇄정치를 좀 더 넓은 달구벌의 공간에서 개방정치로 전환했다면 국민통합을 이뤄 더 큰 나라로 발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 후삼국시대는 어떠했을까?
서기 927년 9월(고려태조10년) 고려(후고구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팔공산 전투가 있었다. 팔공산 전투는 신라 왕실이 견훤 군에 의해 도륙됐다는 소식을 듣고 왕건이 정예기병 5천 명을 거느리고 공산 동수(현재 동구 지묘동)에서 경주로부터 회군하는 견훤군을 맞아 싸운 전투다. 견훤군은 신라를 공격해 대승함으로써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다 보급품이 넉넉했지만, 왕건군은 원정으로 피로 누적과 작전실패(기병은 계곡전투에 불리함)로 대패하고 말았다. 포위망을 뚫고 겨우 목숨을 건져 탈출한 왕건으로서는 그 완패한 팔공산 전투가 신라민심을 난폭한 견훤으로부터 의리 있는 왕건으로 돌리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8년 후인 935년 신라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함에 이르게 된다. 역사란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견훤이 대구의 중요성을 알고 군사를 상주시켜 민심을 도닥거렸다면 신라민심을 얻어 후삼국을 통일했었지 않았겠냐는 상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략요충지인 대구는 지금 어떠한가? 대구는 2003년 252만 9천여 명이란 최고의 인구기록을 보인 후, 계속된 감소세에서 2010년 잠시 반등에 성공했다가 다시 5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10월 현재 248만 9,847명을 기록해 서울 다음으로 가파르게 인구감소가 되고 있다. 그중 20~29세가 32만 6,982명으로 41만 8,213명인 50~59세 장년층보다 훨씬 적고 전체인구의 13%에 불과하다.
즉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대 청년층이 10년간 대구시 인구의 주요 유출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성로와 대학가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리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들만 많이 눈에 띈다. 도심 번화가 역시 저녁 9시 이후엔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거리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앞으로 복지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세금 낼 청년층은 줄어들고 복지 소비할 노년층이 많아지면 대구시 재정파탄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그나마 대구사회에 활성화된 부분은 있다. 바로 정치 분야이다. 중앙권력인 국회의원과 지방권력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넘치고 있다. 이런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출마에 앞서 세 불리기 포럼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구인가증가대책, 청년일자리창출, 노인인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구를 살림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을 들어보자.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부터 와서 대구에 근무했거나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들의 공통적 시각은 대구인이 너무 보수적이란 점이다.
필자도 고향인 대구에 온지 7년이 넘었지만, 대구사람들이 개방적,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모자라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사람이 많다는 걸 아직 실감하고 있다. 외부의 좋은 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변화한다는 점에 대구사람들이 인색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구에 살면서도 자기 동네만 알고 이웃 동네의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대구의 인구감소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앞으로의 노인복지문제는 당면한 정책이슈임에도 대구인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청년일자리창출이 당장 어렵다면 대구 인구증가를 위해 타 지역으로 나간 대구 경북 출신 사람들, 노년에 모두 대구로 이주해 여생을 보내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와 대구에서 살며 세금을 내고, 소비하며, 어릴 적 친구들과 옛날 추억 이야기하며 느리게 사는 것이 수도권의 바쁘게 돌아가는 삶보다 더 느긋하지 않을런지? 그리고 풍부한 사회경험과 다양한 식견들을 대구살리기 멘토 역할에 활용하는 것이 고향을 위한 진정한 기여가 아닐런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대구시에서 정책으로 잘 다듬으면 실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15. 11. 14
초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고산골에서
신동필